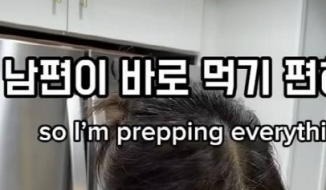|
한국의 경우 이 금액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6.5%, 외환보유액의 85%에 이르는 규모다. 경제학계는 "만일 실제 자금이 단기 유출된다면 통화가치 급락과 외화 유동성 경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화 약세가 제조업 수출 경쟁력까지 훼손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비상 모니터링 체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도 현실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에서 "이른바 '트럼프 외국인투자 펀드'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재량으로 운용된다면 사실상의 국부펀드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투자금이 의회의 견제 없이 쓰이고, 정치적 친분이 있는 인사들에게 자금이 배분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사정은 단순하지 않다. 일본 내 재무성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5,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협상용 상징에 가깝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총자산이 350억 달러에 불과한 현실에서, 연평균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응은 신중하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투자 요구를 단계적으로 충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금보다 실물 투자'로 조건을 바꿔 외압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