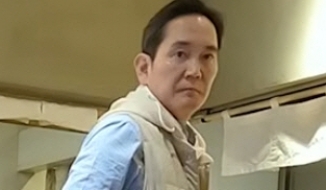|
"일단 문부터 열자." 최근 전국적으로 번지는 광역 행정통합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 기류다. 과거 부산·울산·경남이나 대구·경북의 사례처럼 세부 조건을 따지다 골든타임을 놓쳤던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정치·재정·사회적 요구가 한데 맞물린 이른바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린 시점으로 규정한다.
행정통합 논의의 재점화는 윤석열 정부 초기 대구·경북 통합 구상에서 비롯됐다. 당시에는 통합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나, '광역 단위 통합'이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지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후 논의는 대전·충남을 거쳐 최근 광주·전남까지 확산되며 단일 지역 이슈를 넘어선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방침을 시사하면서, 행정통합은 개별 지자체의 선택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격상됐다.
과거의 통합 시도들이 번번이 무산된 이유는 '디테일'에 있었다. 통합 청사의 위치, 공무원 정원 조정, 시·군·구 간의 이해관계 등 세부 조건을 하나하나 확정하려다 논의가 길어지고 결국 동력이 소진되는 일이 반복됐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다르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과 재정적 수단이 동시에 확보되는 시기가 길지 않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60여 종에 달하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과 같은 실무적 난제는 통합 결정 이후의 과제로 돌리더라도, 우선 '통합'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한다는 '선(先) 결단'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행정통합은 모든 설계를 완성한 뒤 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결단하지 않으면 다시 표류하기 쉬운 사안"이라며 "지금 국면은 통합의 완성도보다 결단 가능성이 형성됐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점도 논의의 배경이다. 이미 주민들의 생활권과 산업 벨트, 통근권은 시·도 경계를 허문 광역 단위로 재편됐으나, 행정구조는 낡은 틀에 갇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 행정구조의 개편이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초광역화된 생활·경제 구조를 기존 행정체제로 관리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통합 논의가 동시에 분출되는 것은 지금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동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