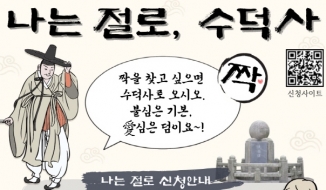|
14일(현지시간) AP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캄보디아의 부동산 개발 및 금융 대기업인 '프린스 홀딩 그룹'의 천즈(38) 회장을 사기 및 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150억 달러(21조 4170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된 범죄 정황으로 기소한 것인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천즈 회장은 최대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수익으로 압수된 비트코인 역시 미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압류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를 넘어 전 세계에서 유인한 노동자들을 감금하고 고문하며 범죄에 강제로 동원한 '현대판 노예' 수용소의 끔찍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범죄에 동원하고 심지어 고문과 살해까지 한 범죄 실태가 알려지며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도 이 같은 범죄조직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 검찰에 따르면 천즈가 이끄는 범죄 제국은 '돼지도살(Pig Butchering)'이라는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시지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돼지를 살찌운 뒤),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도살하는) 수법을 말한다.
프린스 그룹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캄보디아 내에 최소 10곳의 비밀 수용소를 건설했다. 높은 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이 수용소에는 고객 서비스나 IT 지원 등 고임금 일자리를 미끼로 전 세계에서 유인된 이주 노동자들이 감금되어 있었다. 이들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채 수백 대의 휴대폰이 늘어선 자동화 콜센터에서 하루 수천 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출을 시도하거나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전기 고문과 구타 등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미 재무부는 생존자의 증언을 인용해 이들이 "거의 살아있지 않을 때까지"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천즈 개인의 범죄를 넘어 캄보디아의 지배층과 결탁한 '국가 수준의 범죄'로 규정했다. 미 재무부는 프린스 홀딩 그룹 자체를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출신인 천즈는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그의 아버지인 훈센 전 총리의 자문역을 맡아왔고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네악 옥냐' 칭호까지 받았다. 그의 범죄 제국이 캄보디아 정권의 비호 아래 성장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천즈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는 범죄 수익으로 요트·전용기·명품 시계 등을 사들였고 뉴욕 경매소를 통해 피카소 그림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국은 이번 공조 수사를 통해 천즈가 런던에 보유한 자산을 동결했다. 동결된 자산에는 런던 최고 부촌인 애비뉴 로드에 위치한 1200만 파운드(약 228억 원)짜리 대저택과 런던 금융가의 9500만 파운드(약 1808억 원)짜리 오피스 빌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벳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 끔찍한 사기 센터의 주모자들은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그 돈으로 런던의 집을 사들이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이 네트워크가 야기하는 초국가적 위협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