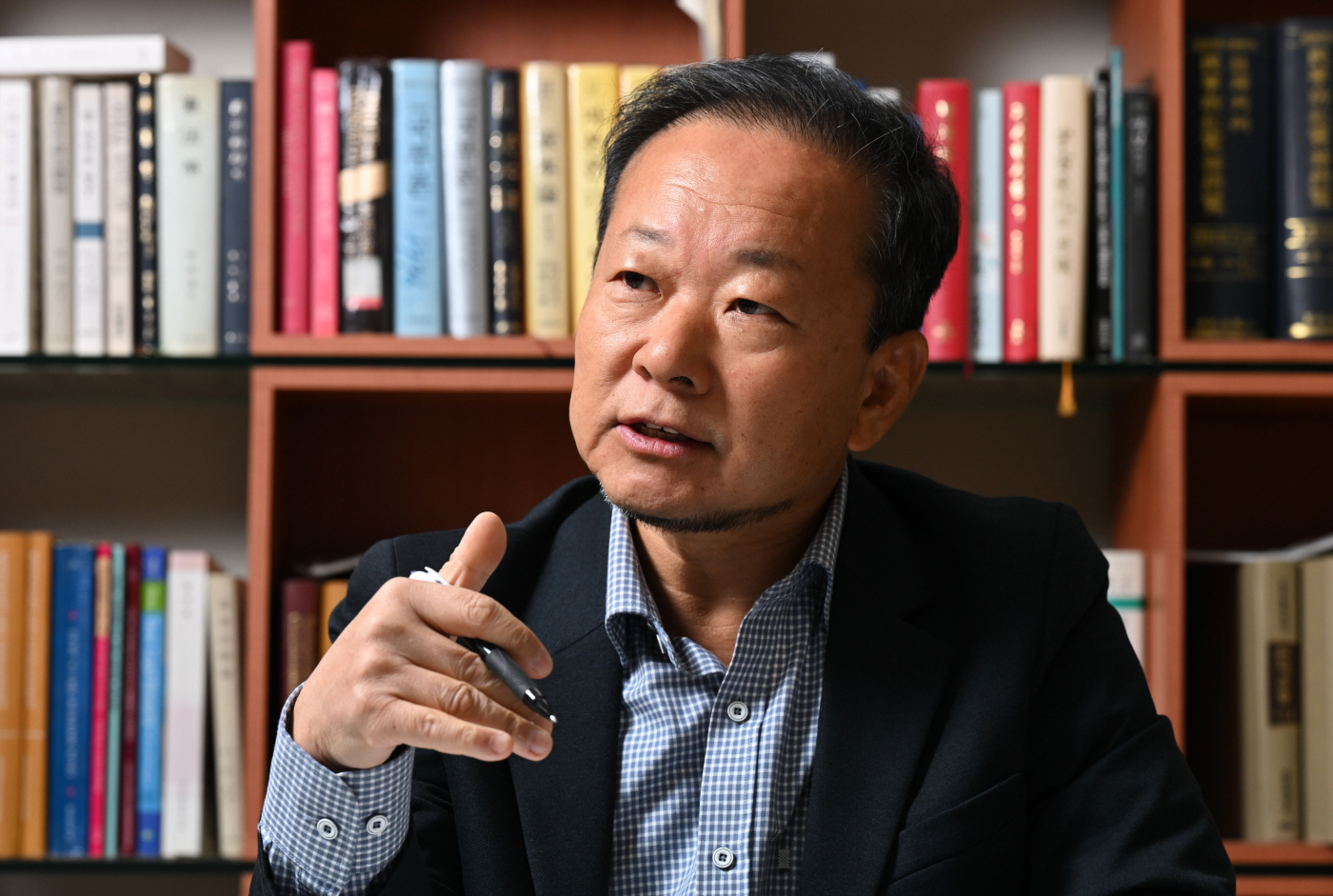헌법 수호·국민 권리 보장 두 기관
상호견제 통한 '폭넓은 구제' 중요
재판소원 등 巨與의 사법개혁 우려
행정부 통제가능성 검사파면법 대신
'국민이 심판' 법관소환제 도입 필요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최종심을 대체할 기관으로 떠오른 헌법재판소(헌재)가 그야말로 그의 '친정'이다. 황 교수는 "친정이 잘되길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법 전문가에게 사건이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그는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은 단연코 '헌법'에 기반해야 한다는 신념에서다.
황 교수는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뺏고, 내 입맛에 맞게 사법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의 구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 분립은 독재를 막는 최후의 안전 장치"라며 "독재의 완성은 사법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의 권한이 막중해질 텐데.
"헌재와 대법원이 권력 분립-상호 견제라는 구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구조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국민의 권리 보장 측면이다. 우리나라 공법(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사건은 헌재가 생기기 전에는 대법원이 대부분 처리했다. 그런데 전체 사건 중 아주 일부만 담당했다. 나머지는 '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재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재가 들어서면서 국가와의 법률 관계를 다룰 수 있는 공법 재판 기능이 확 열렸다. 이를 두고 '무혈의 사법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다. 대법원도 사건을 부랴부랴 늘리기 시작했다. 그 덕에 국민은 소송 과정에서 폭넓은 구제 수단을 갖게 됐다. 권력의 분립은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를 만들고, 그 경쟁 구도는 국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 두번째는 독재를 막는 장치라는 점이다. 과거 대법원만 있을 때는 대법원장 하나만 장악하면 사법권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다. 실제 박정희·전두환 시절엔 대법원장만 쥐면 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헌재와 대법원이 나눠져 있다. 형사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과 국가 공권력 통제를 다루는 헌재 두 곳을 모두 장악해야만 사법권을 흔들 수 있는 구조다. 만약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친다면 단 한 기관만 장악해도 전체 사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 명목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되는데.
"헌법에 명시된 사법행정권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사법행정권의 주체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거나 보충하는 도구로서의 역할 정도만 가능할 뿐이다."
-판검사 징계·파면법도 거론되고 있다.
"판검사의 신분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외압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판단하고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분 보장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약화하는 입법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판사와 검사를 인사권으로 통제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오히려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부를 파면할 수 있는 '법관소환제'의 도입이 적합하다."
-개혁의 당사자, 사법부의 역할이 있다면.
"사실상 거대 여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사법부가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면 위헌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목소리를 정치적 타도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개혁의 과정이 잘못됐다면 논리적으로 격파하고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이것이 디베이트(토론) 과정이고,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이다. 국민 역시 본인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헌법 가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