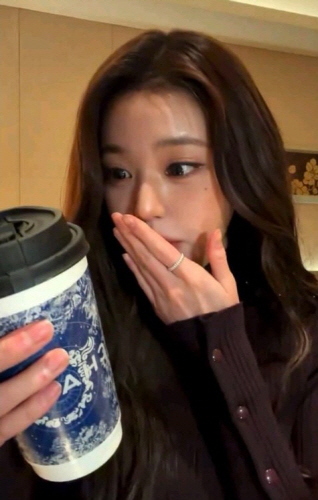K드라마의 약점이 해외에서는 특장점으로 호평받기도
국내 제작사 자립 돕는 제도·제작 시스템 변화 필요해
|
국내 대중 문화 콘텐츠를 나름 비판하고 분석하는 처지에서 한류 열풍은 살짝 당황스러운 현상이었다. 기억 상실증과 출생의 비밀, 삼각 관계와 천편일률적인 남녀 캐릭터 묘사 등 사골처럼 우려먹었던 자극적인 소재와 설정이 정작 다른 나라 시청자들에서는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받아들여지고 'K드라마가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며 오히려 찬사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또 드라마 제작 현장의 오랜 병폐처럼 취급받았던 '쪽대본'이 외국 드라마 전문가들에게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대본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선진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에 어리둥절하곤 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해외에서의 호평이 그때까지만 해도 '프리즌 브레이크' 등과 같은 '미드'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던 창작자들에게 막연한 자신감을 심어준 듯 싶다. 이후 20여 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축적된 자신감은 수 차례의 시행 착오를 거쳐 막연하게나마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을 이끈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오징어 게임'이 남긴 업적을 음미하고 만끽할 시점인가? 아니다, 오히려 업적보다는 숙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때다.
가장 시급한 숙제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마련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이들이 부가 가치 창출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IP) 확보를 돕는 등 보다 멀리 내다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작품 개발·기획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도 자체 자본이 부족해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혹은 방송사에 IP를 내주고 영세한 하청 업체 정도로만 머무는 제작사들의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튼튼한 산업적 토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대본을 뽑아내는데 있어 집단 창작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번에 시즌 3를 보고 느낀 점이다. 제작자이자 연출자인 황동혁 감독이 각본까지 홀로 겸하면서 시리즈의 주제 의식과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 고군분투한 건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창의력의 고갈 탓인지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별 매력없이 평면적으로 그려지고 비슷한 설정이 반복되는 단점은 아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단점들의 개선에 특화된 작가들의 손을 빌렸으면 어땠을까 싶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석권까지 K콘텐츠가 바다 건너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성공 소식에 환호만 하고 있기에는 최근 몇 년간 한국 대중 문화 산업이 겪고 있는 '외화내빈' 식 위기의 수준이 너무 엄중하다. 반면교사로 삼을 건 없는지 '오징어 게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