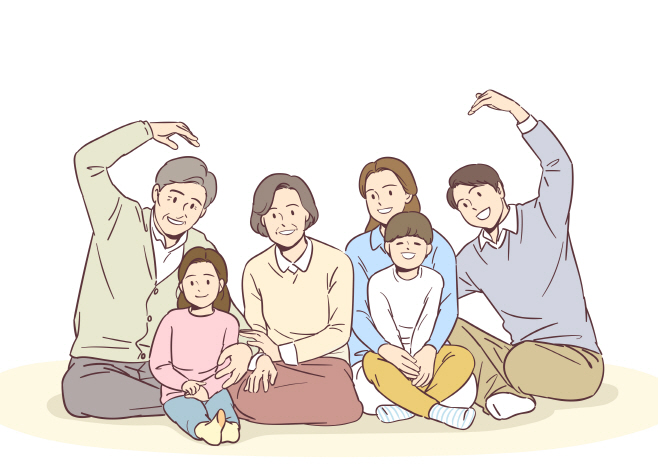|
|
지난 1월 대전에서는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가 치매 증상과 소변 실수가 심해지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인 존속살해범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사건을 접한 대중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한 이에게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이 쏟아졌지만, 간병하던 치매 아버지를 한 순간의 분노로 살해한 이에게는 욕설과 함께 일부 안타깝다는 반응들도 나왔다. 이같은 차이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에서 기인한다.
가족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편안함과 따뜻함을 준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사랑과 보호, 신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바뀌었다. 언제부턴가 실질적인 공동체 기능은 사라졌고, 책임과 돌봄도 희미해졌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확산 등의 용어가 퍼지며 가족 구성원 간 유대는 약화됐고, 정서적 단절은 깊어졌다. 그 결과 가족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지 기반이 아니라, 갈등과 폭력이 응축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작품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르다'고 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사랑·돈·종교·자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보니 어긋나는 그 하나가 범죄 동기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친족 간 범죄는 여러 사회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족은 여전히 소중한 공동체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자꾸만 빈틈을 헤집고 나오려는 우리 안의 괴물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